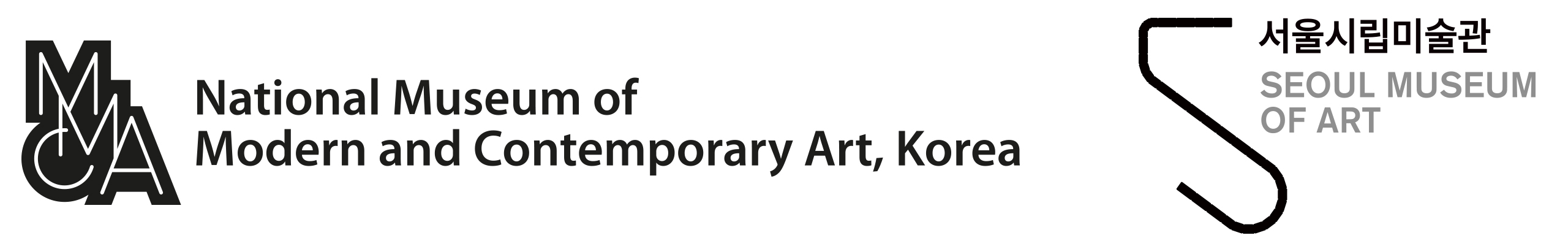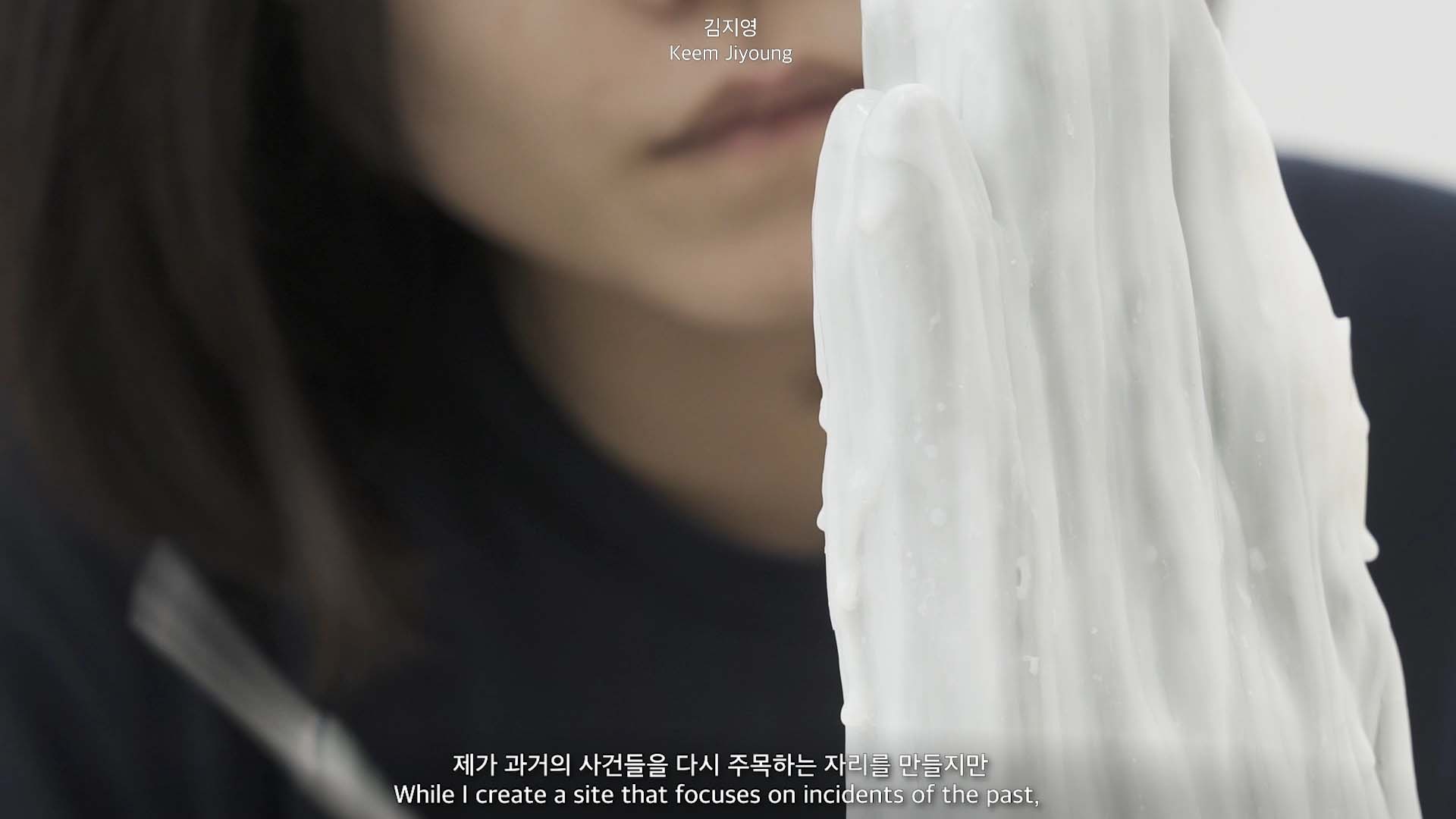작업 소개
57STUDIO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프로그램인 ‘젊은모색2019’ 전시의 미디어 콘텐츠로 아티스트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 및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의 부제인 ‘액체 유리 바다’는 서로 다른 주제와 매체를 각자의 개성으로 다루는 참여 작가 9명에게서 발견한 공통의 키워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인터뷰 시리즈는 각 작가의 작품 세계와 전시 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작가들의 창작 과정, 작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시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담아 관람객들이 전시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김지영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작가입니다. 주로 다루는 매체는 회화이지만 사운드나 영상, 조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김지영 작가 작품 속에서는 사회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그로 인한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앞으로 불러오게 하는 작가입니다.
– 최희승 큐레이터
57STUDIO planned and produced an artist interview series as part of the media content for the Young Korean Artists2019, a program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exhibition’s subtitle, Liquid, Glass, Sea, was inspired by a common keyword discovered across the nine participating artists, who each approach different themes and media with their own unique perspectives. The interview series was created to effectively communicate each artist’s artistic world and the exhibition’s intent. It captures the artists’ creative processes, their thoughts on their work, and their personal views on the exhibition, helping viewers deepen their understanding and engagement with the exhibition.
Keem, Jiyoung is an artist who addresses social issues in her work. While she primarily works with painting, she also incorporates sound, video, and sculpture into her practice. Through her works, Kim Ji-young continuously reminds us of the disasters caused by the collapse of social systems and the victims affected by them, bringing these issues to the forefront of our consciousness.
– Choi Heeseung (Cu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