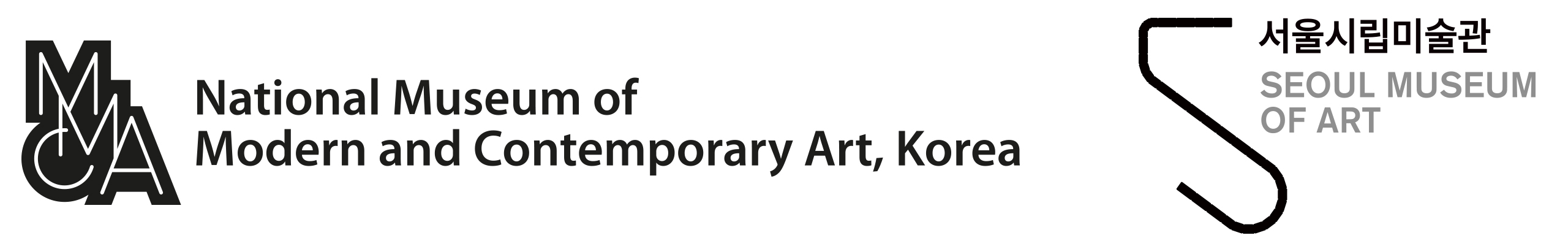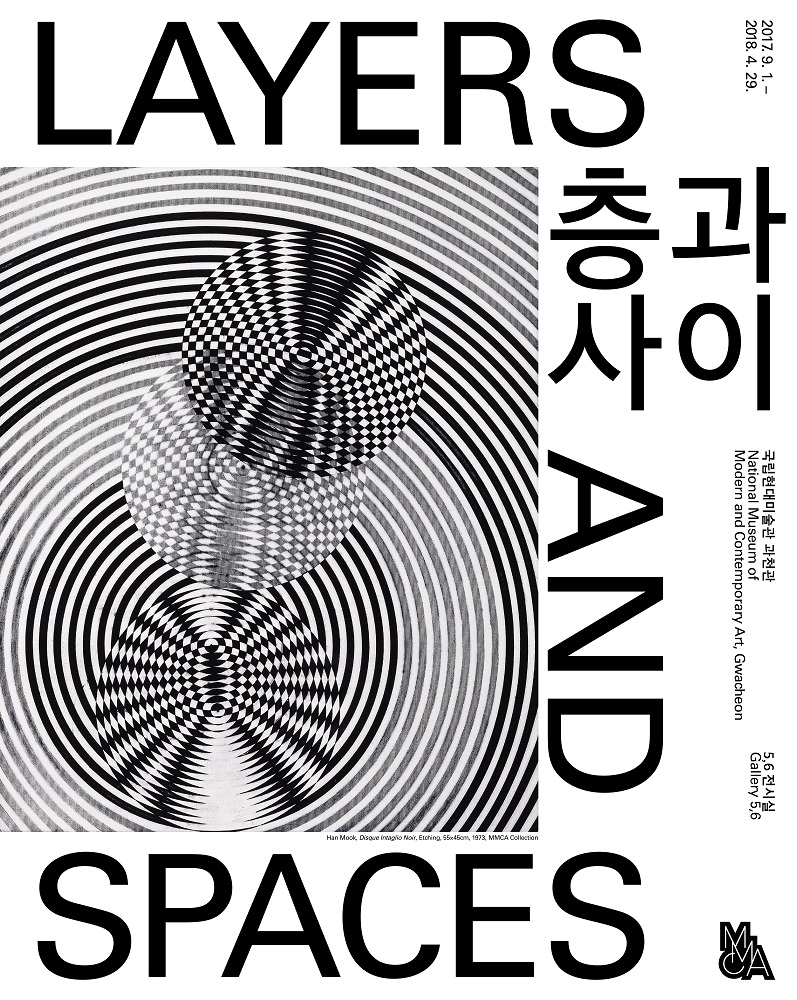| 작가 김동기
저는 판화 작업을 베이스로 해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김동기라고 합니다.
| 벽돌집과 바위섬
저는 작업을 제 주위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바위섬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벽돌집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주변이 다 벽돌집이 있는 그런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주제를 시작하게 됐고 바위섬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덩어리 채로 이것이(집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산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딱 섬을 떼어낸 것처럼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섬이라는 것을 연상을 같이했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판화의 실크스크린, 대량으로 복수적으로 찍어내잖아요. 건축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형식의 집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작품의 드로잉에는 벽돌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것처럼 벽돌을 그려나가고 부수어 내는 방식으로도 드로잉을 하고 그 작품 안을 잘 들여다보면 작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생산이 돼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것이죠.
| 바위섬의 식물들
이번에는 식물들을 넣게 됐어요. 제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식물들은 그 집들에서 붙어 있는 식물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들의 주인들이 조경이라고 하나, 각자의 집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지어 놓았는데 세월이 2, 30년 흐르니까 어떤 집들에는 비가 들어오지 않게 막기도 하고 그리고 화분을 너무 많이 놓은 집도 있고 담쟁이 덩굴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집도 있고 그 안에서의 식물들을 채집해 가지고, 그것을 드로잉해서 섬에 윗부분에 식물들이 자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다 종이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를 컷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조합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이번 작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조금은 있어요. 그때는 (재개발에 대한) 충격이 조금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것의 표현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변화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에 무엇인가가 덧대어 지고 이제 의미가 생기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식물들도 거기에다가 생기는 것이고 무엇인가 변화들이 생기고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은 조금 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 있고, 좋고 아름다웠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한 거를 조금 더 이 작업에서는 넣은 것 같아요.
| 판화에서 회화, 설치, 조각 작업으로의 확장
판화라는 것이 기술을 너무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판화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기의 감성,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잘 똑같이 할 수 있는지 복제를 얼마나 똑같이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것을 저는 대학교 때 많이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있었어요, 약간은, 제 작업도 목판화를 할 때 ‘아, 이것을 얼마나 잘 팔까.’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 왔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림을 그려 나가고, 그러면서 조각도 하게 되고 판화라는 기법, 기술적인 면, 그것을 이렇게 놓았어요. 놓으면서 그림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리고 있어요, 그냥 그린다는 게 순간 즉흥적인,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슷해요. 건축을 하면서 쌓이고 부서지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페인팅에 접목해 가지고 하고 있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해소하는 것이에요. 제가 노동의 시간을 가진 그런 판화 작품, 굉장한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해소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페인팅을 하면서 저의 작업을 해소하고 있고 그것 또한 저의 작업이 되고 있고 조각은 제가 목판화를 조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쉬는 동안 나무를 이제 조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업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학교가 여러 작가, 여러 사람, 여러 매체 사람들이 같이 수업을 받고, 크리틱을 다양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이 판화 안에서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 계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목판화도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조금 많이 안하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부를 했었던 거죠. ‘아, 나는 변화를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안 하게 되고 그랬는데 또 거기(제주도)에서 느끼는 감정에서는 ‘목판화로 내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목판화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사람이 조금 유연해지나 아마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작업이 천천히 저는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팅과 판화, 조각 이러한 것들도 어느 순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 작가의 자연 그리고 유연한 변화
제가 자연에 대한 이제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제주도에 작업을 하러 가게 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 더 많아졌죠. 자연에 대한, 풀에 대한, 나무, 그것이 이루어지는 숲 그러한 것들도 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시도 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자연에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것을 그냥 보고 싶고 거기서 느끼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훼손을 하고 있죠, 지금. 훼손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려고도 하고 있고, 그 자연 안에 자기 집을 지어서 그것을 보고 있어야지, 이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자연보다는 저는 개발에, 개발되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풍경들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의 이제 의견을 저는 예술, 미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제가 해 놓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관객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작품을 보고 ‘아, 옛날 자기 집이 집과 동네가 떠올라서 너무 옛날의 향수를 느꼈다,’ 라는 분도 있고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반대되는 것들이 조금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있지는 않아요, 흐리멍텅한 약간 흐리멍텅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것을 조금은 순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한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