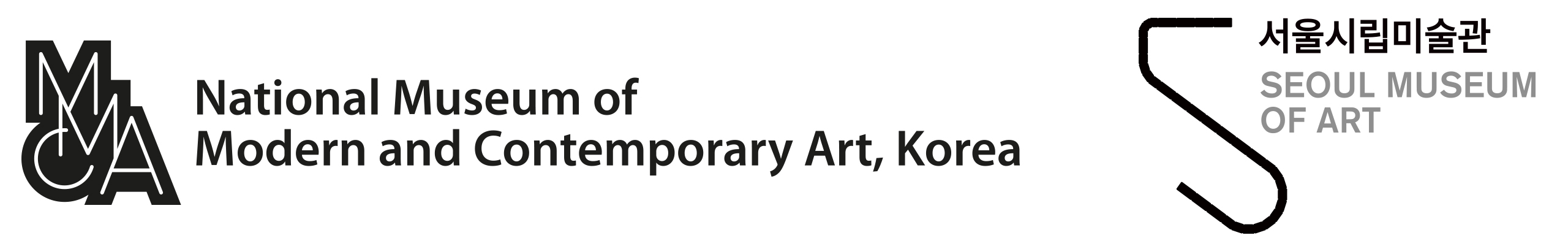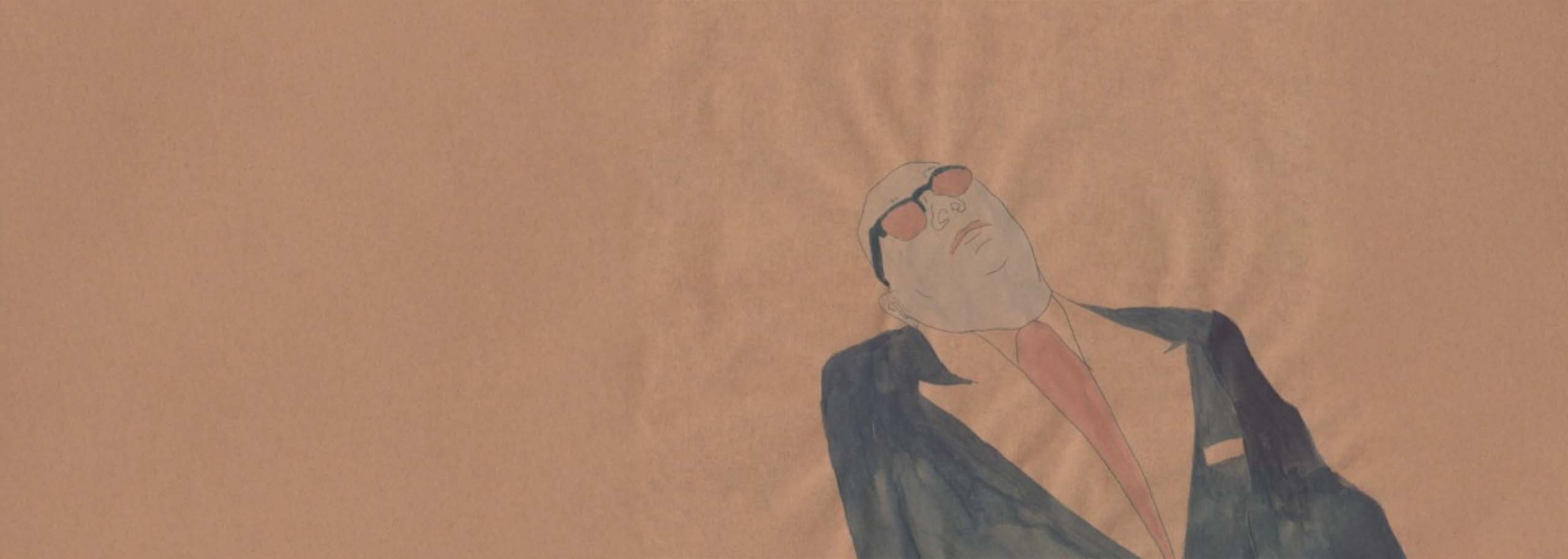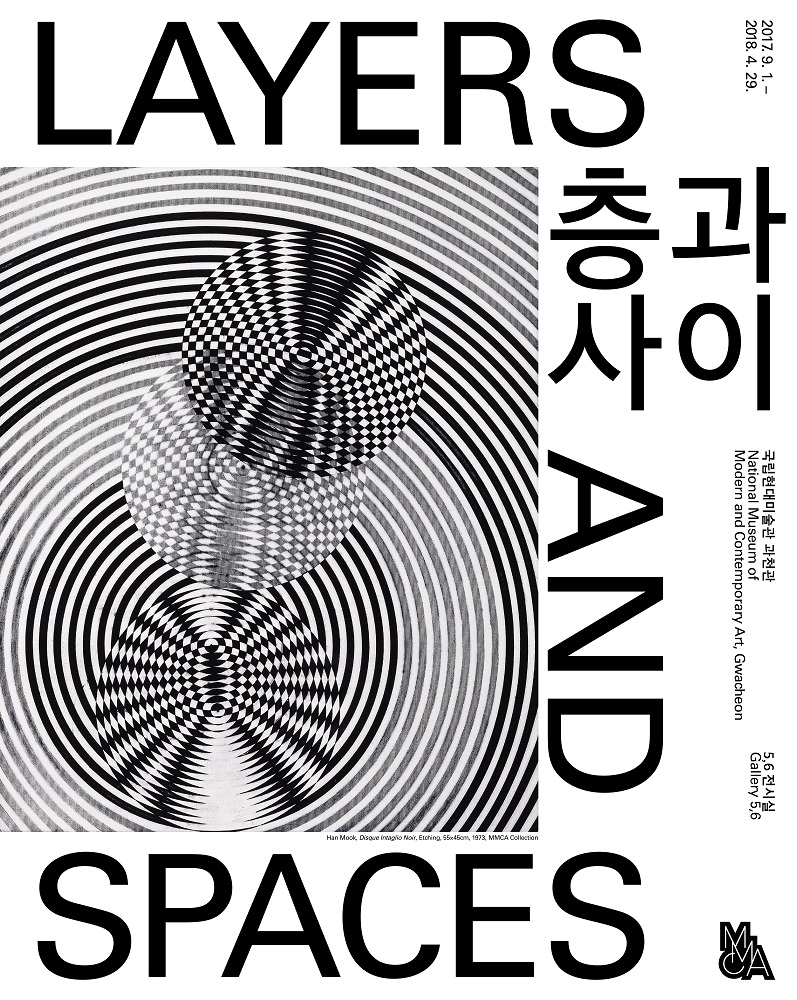| 작가 노상호
저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들을 기반으로 먹지를 대고 그리면서 계속 이미지를 생산해 내고 그것을 유통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노상호 작가입니다.
| <태어나면 모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에 대하여
큰 200호 사이즈의 캔버스 작업으로 하는 <태어나면 모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는 제가 작년, 2016년에 제작했던 작업인데 먹지 드로잉을 A4 그림 단위로 매일매일 하나씩 생산하고 그것을 ‘데일리 픽션’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다시 복사를 해서 트레이싱 한 것들을 다시 모아서 어떤 큰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지도처럼 큰 작업으로 풀어낸 것이 이제 그, 200호 작업 시리즈들이고 제가 그림 그리는 태도나 이미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얇고 팔랑거리는 사람이다, 먹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저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낭창낭창하게 걸려 있는 그림들 사이를 관객들이 거닐 수 있도록 한 작업이고요. 나머지 행거 작업 같은 경우는 200호 작업에 소스가 됐던 그림들 A4의 하나하나 단위의 작업들을 모아서 소비재처럼 관객들이 쉽게 만져 보고 돌려볼 수 있게 했던 작업입니다.
| 판화적인 태도
판화를 학부 때 전공을 하면서 매체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판화’ 자체, ‘판화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매체를 많이 사랑하고 드로잉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플랙서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세, 태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서 제 작업 태도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판화과를 나온 것을 항상 말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작업을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판화를 전공했다’라는 것이 매체적으로 작업을 항상 접근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작가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판화의 애티튜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판화를 찍거나 판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판화가 굴러갔던 방식, 판화가 생겨났던 이유들에 어떤 고민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작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작업 안에서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판화 안에 정신적인 면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미지의 유통과 소비
저는 드로잉을 말할 때 제가 드로잉을 매체로 사용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네모 안에 내용들, 이미지도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도 제 작업에 큰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작업을 보는 방식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미지를 대하는 방식들을 관객들도 똑같이 경험함으로써 다른 식으로 이미지를 대하는 태도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제작을 해서 다시 올리잖아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면 제가 가져온 이미지들처럼 제 이미지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이미지들이 된 것처럼, 제가 이미지들을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쉽게 스톡 이미지들을 훔쳐 오는데 그 이미지들처럼 제 이미지를 누군가 사용하고 흘러가고 또 잊혀지고 이런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주 방대하게 쏟아지는 이미지들 사이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작게 그래서 유통이라는 말도 저를 지나가서 계속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현실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리트윗이나 리포스트를 통해서 옮겨지기도 하고 다시 자기가 찍은 사진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옮겨지고 그렇게 이미지가 계속 확산되고 번져 나가는 것이 저의 유통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유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이나 제 세대가 소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더 유연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소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말씀하신 판화의 방법이기도 하고 시대에 맞춘 어떤 매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야지만 제 작업이 더 명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가상의 이미지를 항상 업로드를 하는 사람인데요. 가상에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다시 어떤 나의 필터를 거쳐서 다시 가상에다 업로드를 하는 사람인데 가상이 있으면 그냥 전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시를 해야 할 이유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SNS에 그림이 올라가고 저의 SNS에서의 활동들을 봤을 때도 저는 그것이 미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이 어떻게 전시로 풀어질 것인가.’에 있을 때 소비 방식이나 유통 방식을 반드시 드러내지 않으면 전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보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 세계로 불러 들어왔을 때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작업의 반경과 SNS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하셨던 동료 작가들 사이에서도 유독 더 소비를 시키는 사람이고 완전 태워 버리는 단계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저는 작년만 해도 그거에 대한 엄청난 피로감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도 있고 그래서 개인전에서 태도를 보여주는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 너무 빨리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는데 너무 그것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존 미술계에 어필하기 위해서? 마치 너무 진지한 사람처럼 엄청 진중하게 스토리를 쓴 사람처럼 근데 내가 그걸 가볍게 소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좀 이격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심했기 때문에 빨리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여겼고 그리고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지점은 ‘빨리 소비시키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더 빨리 태우고 싶어요. 그래서 태우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다시 계속 이 작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작업이 쌓여서 몇 년 뒤에 또 다시 태워 버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